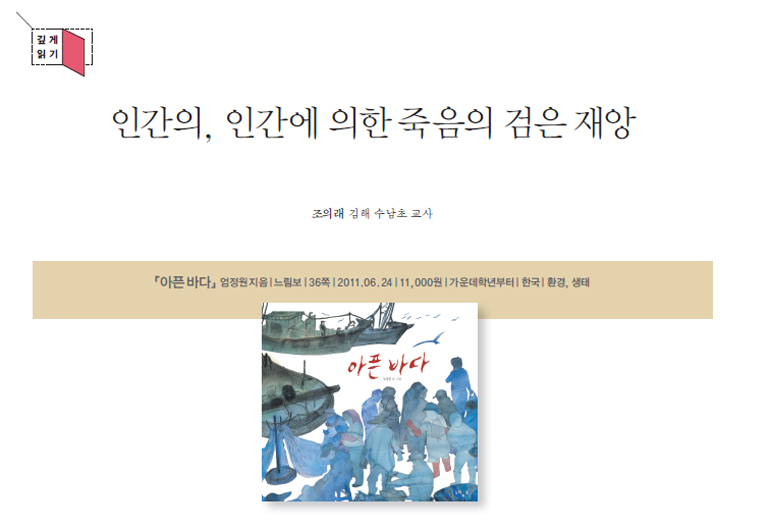어린이 새책 깊게 읽기 - 인간의, 인간에 의한 죽음의 검은 재앙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불현듯 떠올라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다. 환경과 생태 문제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건과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떠올랐다. 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코끝에서 어질한 기름 냄새가 나고, 뇌의 주름마다 기름때가 끼어 있는 것 같다. 바다를 좋아해서 지금도 바닷가에 살고 있고, 바닷가 학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하다.
15년 전, 여수 앞바다에서 씨 프린스호가 좌초되어 내가 근무하던 거제 해안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힌 적이 있었다. 학교가 바닷가 앞에 있어서 갯벌에서 숨을 쉬던 갯지렁이까지 숨을 헐떡이며 수면으로 떠올라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닥쳐올 일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기름제거 작업을 하며 그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아파했던 기억은 오래갔다. 그 뒤 2007년 12월 태안에 또 다시 재앙이 닥쳐왔다.
평화로운 삶의 터전에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원유는 씨 프린스호 사고 당시 유출량의 두 배였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선박 유류 사고의 유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급기야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태까지 갔던 끔직한 재앙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모금에 동참하며 함께 했으나 아직까지 태안은 여전히 아프다. 그림책 『아픈 바다』는 죽었다 살아나도 아픈 상처는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책이다. 전 지구적으로 한 해 동안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다.
90년대 동안 태안 기름유출량의 100배에 달하는 100만 톤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다. 1차 에너지의 약 50% 이상을 석유로 충당하며 외국에서 거의 전량의 석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0.01%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검은 재앙은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며 이익을 좇는 화석자본주의 속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앙이란 점이 더 끔직하다. 오직 인간의, 인간에 의한 죽음의 검은 재앙이다. 화석 연료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연료이다. 수력과 목재의 불충분한 공급은 자본주의의 생산 가속화와 확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선택된 것이 석탄이고 곧 석유로 대체되었다. 화석 연료가 자본의 가속화와 이익의 축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화석 연료는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자본이 원하는 만큼, 시간에 관계없이 비축하고 투입하여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만든다. 기름유출 사고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을 낀 태안 기름유출 사태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이 발생하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삶의 타격을 온몸으로 받는다. 살기 위해선 떠나야 한다. 환경재난이 닥친 바다가 유일한 삶의 터전에서 맨손어업을 하며 살아가는 『아픈 바다』 속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도시의 소시민으로 살아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예고한다.
모든 그림책이 그렇듯 『아픈 바다』 역시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읽는 환경 그림책이다. 바다가 오염되자 섬마을 고깃배들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못한다. 부서지는 흰 포말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다. 활기찼던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섬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떠나지 못하는 존재만이 남아 떠난 자를 기다린다.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일상은 지루하고 길다. 불러도 대답 없는 아빠를 따라서 마지막 남은 갈매기도 떠난다.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아빠가 돌아오면 아이도 도시로 떠나겠지만 아픈 바다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 수밖에 없다. 갯가에 갯것들이 숨 쉬지 못하면 그곳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다.
『아픈 바다』는 신예작가 엄정원의 첫 그림책인데 주제 의식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목탄과 콜라주로 표현한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상징과 면과 면, 각 면의 여백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자극한다. 생명의 푸른색과 재앙의 검은색으로 절제된 그림과 탁월한 표현 기법에 작가의 주제 의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앞면지의 푸른색이 뒷면지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미 작가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독자에게 선명하게 다가온다. 슬픔이 가득한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욱 절망으로 몰아간다.
작가는 섬마을 사람들 얼굴은 묘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생략이 주는 힘은 오히려 강렬하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따라갈 수 없는 아이, 기다리며 지쳐가는 사람들, 절망적인 삶에 지쳐 누운 엄마… 이들의 표정을 모두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상상을 자극하며 그림 속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글이 많지 않다. 각 장면마다 한 두어 문장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절제된 그림만큼 글도 절제하여 이야기를 담고 주제를 살렸다. 짧은 글로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잘 나타내고 길을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자체가 말하는 주제가 분명하고 이야기가 풍성하여 오히려 그림이 나타내는 다양한 해석을 제한하는 느낌을 받았다. 글이 없었다면 더욱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태안은 살아 있다』(희망제작소. 동력)와 함께 겹쳐 읽는다면 더 값진 책이 될 것이다
15년 전, 여수 앞바다에서 씨 프린스호가 좌초되어 내가 근무하던 거제 해안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힌 적이 있었다. 학교가 바닷가 앞에 있어서 갯벌에서 숨을 쉬던 갯지렁이까지 숨을 헐떡이며 수면으로 떠올라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닥쳐올 일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기름제거 작업을 하며 그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아파했던 기억은 오래갔다. 그 뒤 2007년 12월 태안에 또 다시 재앙이 닥쳐왔다.
평화로운 삶의 터전에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원유는 씨 프린스호 사고 당시 유출량의 두 배였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선박 유류 사고의 유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급기야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태까지 갔던 끔직한 재앙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모금에 동참하며 함께 했으나 아직까지 태안은 여전히 아프다. 그림책 『아픈 바다』는 죽었다 살아나도 아픈 상처는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책이다. 전 지구적으로 한 해 동안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다.
90년대 동안 태안 기름유출량의 100배에 달하는 100만 톤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다. 1차 에너지의 약 50% 이상을 석유로 충당하며 외국에서 거의 전량의 석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0.01%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검은 재앙은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며 이익을 좇는 화석자본주의 속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앙이란 점이 더 끔직하다. 오직 인간의, 인간에 의한 죽음의 검은 재앙이다. 화석 연료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연료이다. 수력과 목재의 불충분한 공급은 자본주의의 생산 가속화와 확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선택된 것이 석탄이고 곧 석유로 대체되었다. 화석 연료가 자본의 가속화와 이익의 축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화석 연료는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자본이 원하는 만큼, 시간에 관계없이 비축하고 투입하여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만든다. 기름유출 사고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을 낀 태안 기름유출 사태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이 발생하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삶의 타격을 온몸으로 받는다. 살기 위해선 떠나야 한다. 환경재난이 닥친 바다가 유일한 삶의 터전에서 맨손어업을 하며 살아가는 『아픈 바다』 속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도시의 소시민으로 살아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예고한다.
모든 그림책이 그렇듯 『아픈 바다』 역시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읽는 환경 그림책이다. 바다가 오염되자 섬마을 고깃배들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못한다. 부서지는 흰 포말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다. 활기찼던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섬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떠나지 못하는 존재만이 남아 떠난 자를 기다린다.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일상은 지루하고 길다. 불러도 대답 없는 아빠를 따라서 마지막 남은 갈매기도 떠난다.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아빠가 돌아오면 아이도 도시로 떠나겠지만 아픈 바다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 수밖에 없다. 갯가에 갯것들이 숨 쉬지 못하면 그곳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다.
『아픈 바다』는 신예작가 엄정원의 첫 그림책인데 주제 의식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목탄과 콜라주로 표현한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상징과 면과 면, 각 면의 여백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자극한다. 생명의 푸른색과 재앙의 검은색으로 절제된 그림과 탁월한 표현 기법에 작가의 주제 의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앞면지의 푸른색이 뒷면지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미 작가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독자에게 선명하게 다가온다. 슬픔이 가득한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욱 절망으로 몰아간다.
작가는 섬마을 사람들 얼굴은 묘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생략이 주는 힘은 오히려 강렬하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따라갈 수 없는 아이, 기다리며 지쳐가는 사람들, 절망적인 삶에 지쳐 누운 엄마… 이들의 표정을 모두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상상을 자극하며 그림 속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글이 많지 않다. 각 장면마다 한 두어 문장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절제된 그림만큼 글도 절제하여 이야기를 담고 주제를 살렸다. 짧은 글로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잘 나타내고 길을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자체가 말하는 주제가 분명하고 이야기가 풍성하여 오히려 그림이 나타내는 다양한 해석을 제한하는 느낌을 받았다. 글이 없었다면 더욱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태안은 살아 있다』(희망제작소. 동력)와 함께 겹쳐 읽는다면 더 값진 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