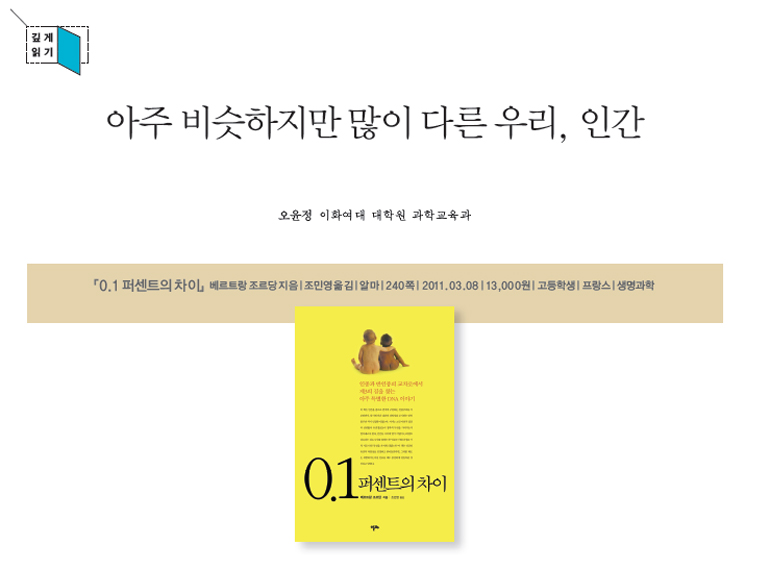청소년 새책 깊게 읽기 - 아주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우리, 인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내 일생을 통틀어서, 나를 울린 첫 번째책은 『플랜더스의 개』였다. 결말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튿날 아침에 눈이 퉁퉁 붓고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게, 아홉 살 나이에 나는 비로소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음을 배웠고 한동안 동화 속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 과학책을 읽고서도 감동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시튼 동물기』를 통해서였다. 지금도 표지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책 안에는 당시 내 인생보다 사연 많고 파란만장한 동물들의 삶이 오롯이 들어 있었다. 시튼의 동물 이야기는 어린 나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나의 과학 책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정이 길면 실망도 적지 않은 법. 하늘 아래 과학 도서가 많고도 많고, 빼어난 과학 저술가도 꽤 되지만 솔직히 과학 분야의 책을 읽고 그 책만으로 감동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베르트랑 조르당의 『0.1퍼센트의 차이』를 만났다.
‘0.1퍼센트의 차이’란 개개의 인간이 가진 30억여 개의 염기 가운데 99.9퍼센트가 일치하고 오직 0.1퍼센트만이 다름을 의미한다. 이 99.9퍼센트의 일치, 0.1퍼센트의 차이는 지구상의 다른 종種. species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동질성이다. 이에 저자는 인간을 인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나, 인종들 사이에 논리적이고 명백하며 영속적이며 사라질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과학적’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0.1퍼센트의 차이는 ‘너무 사소해 무시해도 되는’ 차이라는 뜻일까? 저자는 이러한 견해 역시 분명하게 비판한다. 99.9퍼센트의 일치에 비해서는 대단히 미약하지만 0.1퍼센트의 차이로 인해 개개의 인간은 매우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0.1퍼센트가 무려 300만여 개의 염기라는 엄청난 숫자로 환산됨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저자는 인간은 모두 친족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한다. DNA 염기 서열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각 집단 안의 개인의 차이는 집단 간 평균(집단을 나누는 평균)의 차이보다 열 배나 큼을 보여준다. 이는 아프리카인이나 중국인은 서로 매우 비슷하고, 프랑스인과는 아주 다르다는 상식과 배치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래브라도가 스패니얼보다 우수할까? 도베르만이 독일산 목양견보다 더 나을까? … 양 떼를 지키려면 목양견을 선택하고, 시냇물을 건너려면 래브라도를 앞세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명의 특별한 인간은 그의 DNA 속에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 덕분에 다른 상황보다 특정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상황에서는 덜 능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로 매우 비슷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른 우리, 인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인종적 차이를 부각해 차별을 유도하려는 ‘인종주의’에 맞서면서도, 인간 집단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반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답한다. 일생을 과학 연구에 바친 저자가 과학 분야의 석학을 넘어 진정한 학자로, 당대의 모범적인 지식인으로 우뚝 서는 주장이자 명문名文이다.
“인간이 가진 유전적・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요소들 때문에 특정 인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거부하기 위해 논쟁을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가치들 중 하나, 즉 모든 인간 존재의 평등한 존엄성을 버릴 수밖에 없다. 평등한 존엄성은 생물학적 서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존이 꼭 필요한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을 표현하는 것이다. … 그러니 이 차이를 인정하고 과장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며 그 진가를 평가해, 이를 증오나 대립 또는 배척의 동기로 삼지 말고 기회로 삼자.”
좋은 과학책이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과학이 어떻게 철학과 인문, 사회, 정치를 아우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다 과학책을 읽고서도 감동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시튼 동물기』를 통해서였다. 지금도 표지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책 안에는 당시 내 인생보다 사연 많고 파란만장한 동물들의 삶이 오롯이 들어 있었다. 시튼의 동물 이야기는 어린 나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나의 과학 책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정이 길면 실망도 적지 않은 법. 하늘 아래 과학 도서가 많고도 많고, 빼어난 과학 저술가도 꽤 되지만 솔직히 과학 분야의 책을 읽고 그 책만으로 감동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베르트랑 조르당의 『0.1퍼센트의 차이』를 만났다.
‘0.1퍼센트의 차이’란 개개의 인간이 가진 30억여 개의 염기 가운데 99.9퍼센트가 일치하고 오직 0.1퍼센트만이 다름을 의미한다. 이 99.9퍼센트의 일치, 0.1퍼센트의 차이는 지구상의 다른 종種. species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동질성이다. 이에 저자는 인간을 인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나, 인종들 사이에 논리적이고 명백하며 영속적이며 사라질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과학적’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0.1퍼센트의 차이는 ‘너무 사소해 무시해도 되는’ 차이라는 뜻일까? 저자는 이러한 견해 역시 분명하게 비판한다. 99.9퍼센트의 일치에 비해서는 대단히 미약하지만 0.1퍼센트의 차이로 인해 개개의 인간은 매우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0.1퍼센트가 무려 300만여 개의 염기라는 엄청난 숫자로 환산됨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저자는 인간은 모두 친족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한다. DNA 염기 서열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각 집단 안의 개인의 차이는 집단 간 평균(집단을 나누는 평균)의 차이보다 열 배나 큼을 보여준다. 이는 아프리카인이나 중국인은 서로 매우 비슷하고, 프랑스인과는 아주 다르다는 상식과 배치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래브라도가 스패니얼보다 우수할까? 도베르만이 독일산 목양견보다 더 나을까? … 양 떼를 지키려면 목양견을 선택하고, 시냇물을 건너려면 래브라도를 앞세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명의 특별한 인간은 그의 DNA 속에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 덕분에 다른 상황보다 특정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상황에서는 덜 능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로 매우 비슷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른 우리, 인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인종적 차이를 부각해 차별을 유도하려는 ‘인종주의’에 맞서면서도, 인간 집단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반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답한다. 일생을 과학 연구에 바친 저자가 과학 분야의 석학을 넘어 진정한 학자로, 당대의 모범적인 지식인으로 우뚝 서는 주장이자 명문名文이다.
“인간이 가진 유전적・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요소들 때문에 특정 인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거부하기 위해 논쟁을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가치들 중 하나, 즉 모든 인간 존재의 평등한 존엄성을 버릴 수밖에 없다. 평등한 존엄성은 생물학적 서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존이 꼭 필요한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을 표현하는 것이다. … 그러니 이 차이를 인정하고 과장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며 그 진가를 평가해, 이를 증오나 대립 또는 배척의 동기로 삼지 말고 기회로 삼자.”
좋은 과학책이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과학이 어떻게 철학과 인문, 사회, 정치를 아우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