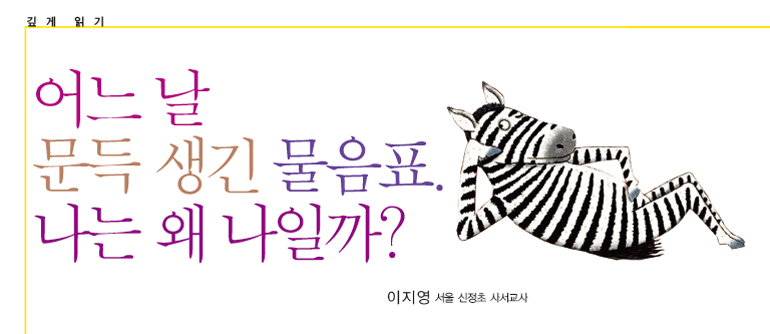어린이 새책 어느 날 문득 생긴 물음표. 나는 왜 나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얼룩말은 왜 얼룩말일까?” 여느 때처럼 제목을 확인하고 앞표지 그림을 살펴본다. 조그만 얼룩말 한 마리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다. 이 작은 얼룩말이 서 있는 초원 위로 펼쳐진 하늘은 온통 얼룩무늬다. 뒤표지까지 펼쳐놓고 보았다. 느낌이 사뭇 다르다. 뒤표지까지 이어지니 얼룩무늬 하늘이 마치 실제 얼룩말 몸의 일부처럼 보인다. 살아있는 커다란 얼룩말에 작은 삽화를 그려 넣은 느낌. “나는 왜 얼룩말일까?” 뒤표지에 적혀있는 소개 글의 첫 문장이다. 앞표지의 제목을 독자를 향한 일반적인 물음으로 본다면 뒤표지의 이 물음은 주인공 자신 ‘나’를 향해 있다. 주인공인 작은 얼룩말의 성장을 예고한다.
나는 요즘 책 뒤표지에 관심이 많다. 때로는 사람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정직할 때가 있다. 그림책도 뒷면지, 뒤표지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그 책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앞표지부터 뒤표지까지의 구성이 아름다운 책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특히 문학류의 그림책은 책 전체가 온 몸(?)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느낌을 줄 때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글쓴이와 편집자와 디자이너와 그린이의 한 호흡이 느껴지는 책. 어쩌면 그림책이라는 매체의 완성도에 관해 나름의 형식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완성도가 높다. 앞뒤 면지의 그림에도 의미를 담았고 책 내용과 겉표지에 맞춰 표제지를 100% 활용하였다.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의 세심함이 책을 펼쳐든 독자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하다. 이제 첫 페이지를 들여다보자. “어떤 얼룩말이 있었어. 얼룩얼룩 줄무늬가 있는 얼룩말. 얼룩얼룩 얼룩말 무리 속 다른 모든 얼룩말처럼 생겼어. 다만 덩치가 조금 작았을 뿐.” 그냥 평범한 작은 얼룩말을 묘사할 뿐이지만 말놀이의 묘미를 충분히 살렸다. 그러다 어느 날 얼룩말은 자신과 비슷하지만 다른 동물을 보게 된다. 바로 ‘말’이다. 작은 얼룩말은 자신과 다른 존재인 말을 알게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것도 아주 심오한 고민에. ‘나는 왜 얼룩말일까.
줄무늬가 있어서 얼룩말일까? 얼룩말이라서 줄무늬가 있는 걸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오래된 논쟁에 비할 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고민을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를 파고드는 녀석의 집요함은 굉장하다.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어진다. “줄무늬는 줄무늬인데 흰색 줄무늬일까, 검은색 줄무늬일까? 검은 바탕에 흰색 줄이 난 걸까? 아니면 흰 바탕에 검은색 줄이 난 걸까?” 그러더니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시키기에 이른다. “난 하얀 걸까? 아니면 까만 걸까? 아니면 하야면서 까만 걸까? 아니면…… 하얗지도 까맣지도 않은 걸까?” 여기까지 읽고 심호흡. 읽는 사람까지 당혹스럽게 만드는 못 말릴 녀석이다. 살다보면 어느 날 문득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물음표가 생긴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심지어 내 안의 내가 나 자신에게 묻기도 한다. ‘너는 누구니?’ 작은 얼룩말은 무엇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외로운 싸움의 시작. 그리고 드디어 녀석은 결심한다. 하얀 줄무늬를 없애기로.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지금의 자기를 잃어버리는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녀석의 변화에 주위 얼룩말들은 이렇게 묻는다. “넌 누구야?” 타인의 이러한 물음은 듣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 진심어린 걱정. 아니면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불편함.
무엇이 되었든 다른 얼룩말들의 시선을 의식한 순간 녀석은 당황한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 바람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운 작은 얼룩말.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침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녀석에게 주위에서는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넨다. “와! 너 다시 돌아왔구나.”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작은 얼룩말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그들은 녀석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저 지켜봐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니까. 별거 아닌 일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 또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이들이니까.
뒷면지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그네를 뛰고 있는 녀석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의도는 좀 더 분명해진다. 하지만 주인공이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을 너무 간결하게 처리하여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흐트러지는 느낌이다. 어쩌면 단순하고 명쾌한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반까지 끌고 온 끈질긴 고민과 갈등에 비해 후반의 느슨한 해결은 몰입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이다. 기대감이 커서였는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며 책을 덮는다.

나는 요즘 책 뒤표지에 관심이 많다. 때로는 사람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정직할 때가 있다. 그림책도 뒷면지, 뒤표지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그 책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앞표지부터 뒤표지까지의 구성이 아름다운 책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특히 문학류의 그림책은 책 전체가 온 몸(?)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느낌을 줄 때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글쓴이와 편집자와 디자이너와 그린이의 한 호흡이 느껴지는 책. 어쩌면 그림책이라는 매체의 완성도에 관해 나름의 형식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완성도가 높다. 앞뒤 면지의 그림에도 의미를 담았고 책 내용과 겉표지에 맞춰 표제지를 100% 활용하였다.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의 세심함이 책을 펼쳐든 독자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하다. 이제 첫 페이지를 들여다보자. “어떤 얼룩말이 있었어. 얼룩얼룩 줄무늬가 있는 얼룩말. 얼룩얼룩 얼룩말 무리 속 다른 모든 얼룩말처럼 생겼어. 다만 덩치가 조금 작았을 뿐.” 그냥 평범한 작은 얼룩말을 묘사할 뿐이지만 말놀이의 묘미를 충분히 살렸다. 그러다 어느 날 얼룩말은 자신과 비슷하지만 다른 동물을 보게 된다. 바로 ‘말’이다. 작은 얼룩말은 자신과 다른 존재인 말을 알게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것도 아주 심오한 고민에. ‘나는 왜 얼룩말일까.
줄무늬가 있어서 얼룩말일까? 얼룩말이라서 줄무늬가 있는 걸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오래된 논쟁에 비할 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고민을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를 파고드는 녀석의 집요함은 굉장하다.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어진다. “줄무늬는 줄무늬인데 흰색 줄무늬일까, 검은색 줄무늬일까? 검은 바탕에 흰색 줄이 난 걸까? 아니면 흰 바탕에 검은색 줄이 난 걸까?” 그러더니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시키기에 이른다. “난 하얀 걸까? 아니면 까만 걸까? 아니면 하야면서 까만 걸까? 아니면…… 하얗지도 까맣지도 않은 걸까?” 여기까지 읽고 심호흡. 읽는 사람까지 당혹스럽게 만드는 못 말릴 녀석이다. 살다보면 어느 날 문득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물음표가 생긴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심지어 내 안의 내가 나 자신에게 묻기도 한다. ‘너는 누구니?’ 작은 얼룩말은 무엇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외로운 싸움의 시작. 그리고 드디어 녀석은 결심한다. 하얀 줄무늬를 없애기로.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지금의 자기를 잃어버리는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녀석의 변화에 주위 얼룩말들은 이렇게 묻는다. “넌 누구야?” 타인의 이러한 물음은 듣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 진심어린 걱정. 아니면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불편함.
무엇이 되었든 다른 얼룩말들의 시선을 의식한 순간 녀석은 당황한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 바람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운 작은 얼룩말.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침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녀석에게 주위에서는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넨다. “와! 너 다시 돌아왔구나.”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작은 얼룩말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그들은 녀석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저 지켜봐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니까. 별거 아닌 일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 또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이들이니까.
뒷면지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그네를 뛰고 있는 녀석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의도는 좀 더 분명해진다. 하지만 주인공이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을 너무 간결하게 처리하여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흐트러지는 느낌이다. 어쩌면 단순하고 명쾌한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반까지 끌고 온 끈질긴 고민과 갈등에 비해 후반의 느슨한 해결은 몰입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이다. 기대감이 커서였는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며 책을 덮는다.